등록 : 2019.04.04 10:16
수정 : 2019.04.04 19:11
보통의 디저트
‘삶이란 더러운 것’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는 그가 델리만쥬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그라도 델리만쥬의 치명적 향기를 맡는다면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델리만쥬의 향기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누구에게나 지하철 문틈으로 그 향기를 맡고 뛰어내리고 싶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실로 가공할 위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오이도로 향하고 있었다. 십오륙년 전 일이다.
이유는 없었다. 내세울 게 넉넉한 수명밖에 없던 나는 종종 아무 지하철이나 타고 종착역에 가곤 했다. 목적지가 의정부역일 때도 있고, 인천역일 때도 있었다. 가서 뭘 하는 것은 없다. 역에 내려 낯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여기는 이렇구나!’ 하며 다시 돌아왔다. 시간 낭비지만, 젊은 나는 급할 게 없었다. 아직 죽음은 까마득히 먼일이라 흥청망청 삶을 낭비하며 살았다.
열차 안은 금정역부터 승객이 급속도로 줄어들더니 안산을 지날 즈음 남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지하철을 통틀어 남은 사람이 나뿐인가 싶어 1량부터 10량까지 직접 확인해 보니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왠지 승리한 기분이 들었다. 무려 2만5000볼트의 전기가 고작 나 하나를 오이도로 옮기기 위해 쓰인다. 이 큰 기계가 나를 위해 움직인다. 심지어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갈 뿐인데 지하철은 전력을 다해 달린다. 전세 낸 셈이다.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었다. 물론 대중교통이기에 나 따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갈 길을 갈 뿐이지만 괜히 감격스러웠다.
그때, 델리만쥬를 발견했다.
텅 빈 차 안 한산한 좌석 한곳에 델리만쥬 한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것이다. 덜컹덜컹. 지하철은 여전한 속도로 달렸고, 햇살이 내리쬐는 창밖으론 논과 산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델리만쥬의 맞은편에 앉았다. ‘빈 봉지를 버린 것일까?’ 싶었지만, 제법 부피감 있는 모습이었다. 반쯤 먹다 놓고 내린 듯했다. 내릴 역을 지나쳐 서두르는 바람에 깜빡했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건 상관없다. 내 맞은편에 델리만쥬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쉽사리 다가가진 못했다. 보는 사람이 없다 한들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는 건 꺼려지는 일이다. 애초에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먹어봤자 맛있지도 않을 것이고, 높은 확률로 식었을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일 수도 있다. 나는 이솝우화 속 여우처럼 델리만쥬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누가 대신 정해주었으면 싶었다.
그때, 계시가 내려왔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오이도, 오이도역입니다.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내방송을 들은 나는 사막을 헤매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처럼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소곳이 놓여있던 델리만쥬 봉투에 성큼성큼 걸어가 대번에 집어 들었다. 느껴지는 무게감에 절로 미소 지었다. 반 이상은 남아있는 게 분명했다.
이윽고 도착한 오이도역. 역을 나와 오이도 해안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어느덧 한낮의 해는 멀리 보이는 바다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괜찮은 하루다. 지하철을 혼자서 탈 수 있어 좋았고, 품에 안은 델리만쥬가 아직 뜨끈해 좋았다. 어쩌면 삶에 필요한 것은 딱히 위대하고 거창한 것들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봉투를 열어 보았다.
안에는, 곱게 싸매진 기저귀가 하나 살포시 들어 있었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아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지금의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글·그림 김보통(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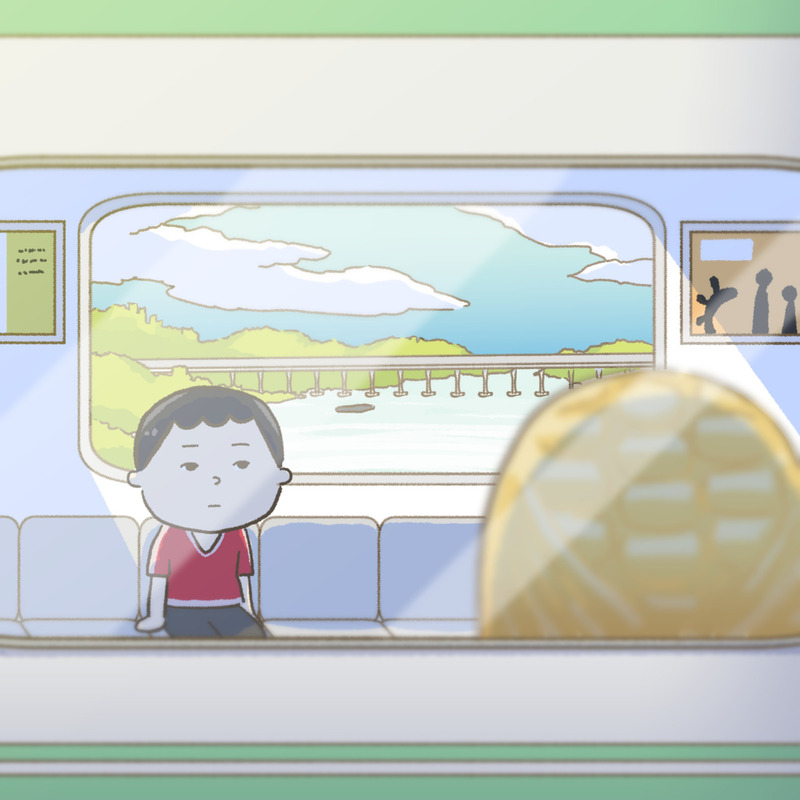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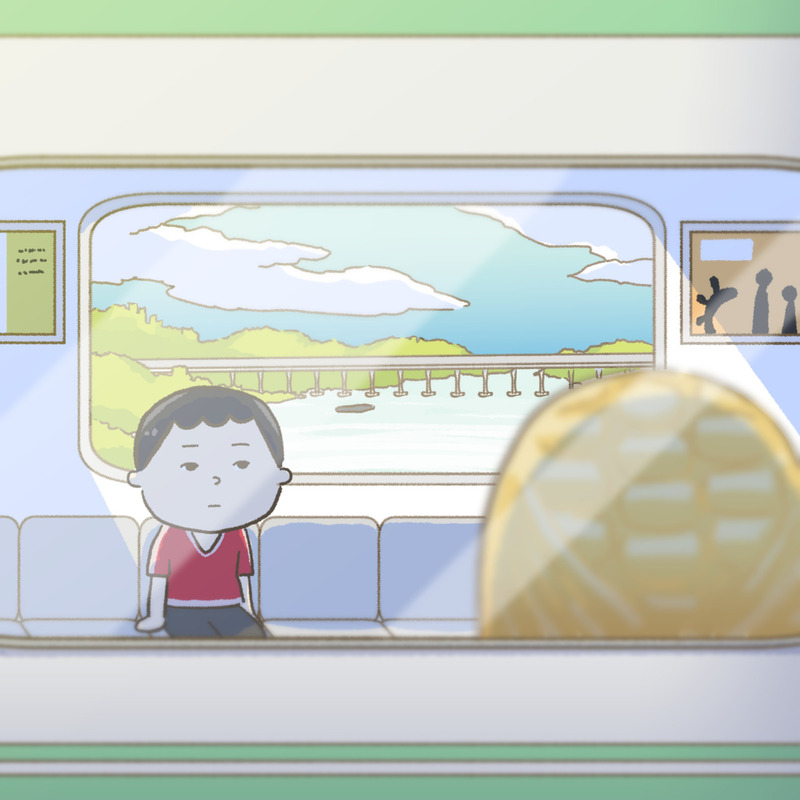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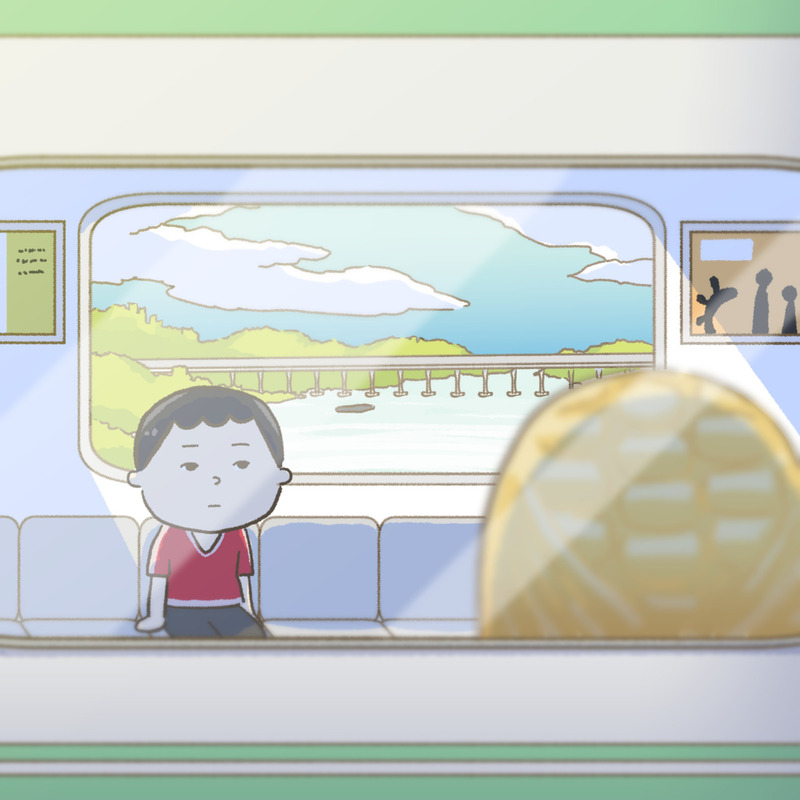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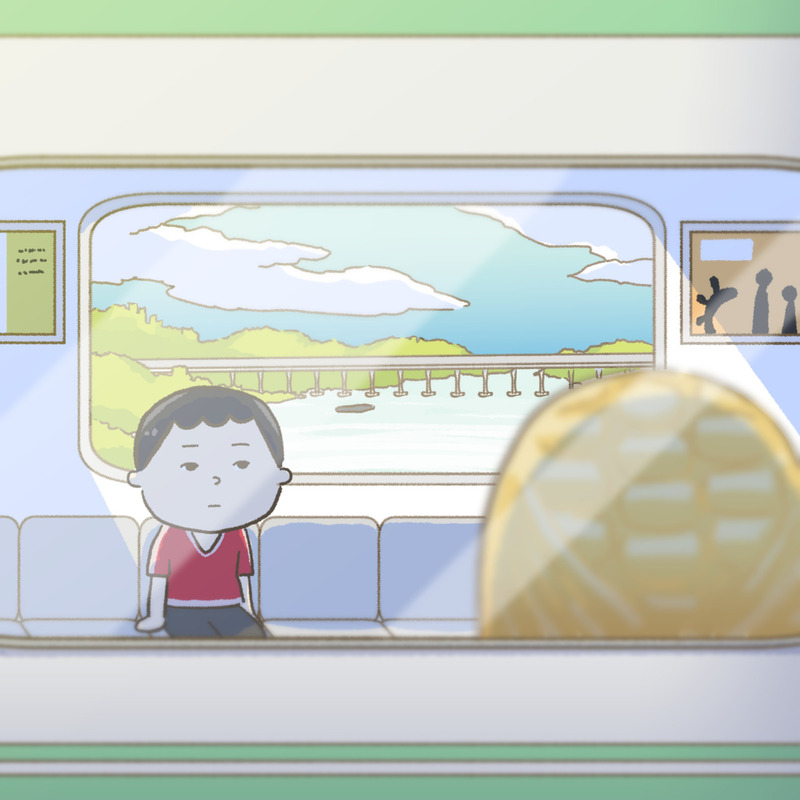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