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Esc] 너 어제 그거 봤어?
안방에 앉아 방송사가 편성한 프로그램 보는 건 중·노년층뿐일 걸!
최근 시작한 <쩐의 전쟁> <에어 시티> 그리고 최근 끝난 <히트>와 <마왕>까지 지금 한국 드라마는 액션, 범죄 수사물 등 장르화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 현상의 뒷면에는 내려받기, 곧 다운로드족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른바 ‘미드’‘일드’ 붐이라고 일컫는 미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인기가 있다. 미드와 일드는 어떻게 한국 드라마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 <매거진 티>의 백은하 편집장과 차우진 기자가 이 현상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백은하: 요즘 시작한 <에어 시티>나 준비 중인 <태왕사신기> 대작 드라마들을 보면 장르물이 대세다. 얼마 전만해도 대작하면 사극이 바로 연결됐는데 말이다.
차우진: 드라마들이 대작화되는 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거고, 또 세계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게 장르다. 국내에서 <씨에스아이>나 <프리즌 브레이크>가 인기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백: 미국에서 자국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건 <디 오 시>(The O.C)나 <길모어 걸즈> 같은 정서적 느낌이 강한 멜로 드라마인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시에스아이>(CSI) 같은 게 훨씬 더 인기있다. 한국방송에서 발빠르게 수입한 <어글리 베티>가 그다지 재미를 못 보는 것도 같은 그런 연유다. 그런 식의 <캔디>나 <미운 오리새끼> 부류의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다.
10년 전이라면 방송사 통과했을까
차: 90년대 문화담론에서 초중반 ‘무국적 감수성’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때 일본 만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서 20~30대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의 핵심 생산자가 되니까 요새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확실히 고전적인 한국 드라마와는 많이 다르다.
백: 최근 시작한 문화방송의 <메리대구 공방전>은 거의 일본 만화를 보는 느낌이더라. 지난해 다운로드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다메 칸타빌레>의 설정이나 연기톤에서 많이 빌려온 것 같기도 하고.
차: <메리 대구>가 재밌는 건 스타일에서는 일본 만화나 드라마와 비슷하지만 이걸 한국식 배경이나 정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 남산 한옥마을에 사는 남녀 루저들 이야기인데, 너무 웃기면서도 지금 백수들이 처한 상황 같은 게 겹쳐 짠한 느낌을 준다.
백: 일본 만화와 무협지, 뮤지컬 등 온갖 갈래를 뒤섞은 형식은 글로벌인데(웃음), 속알맹이는 아이엠에프도 한참 지나서 자신의 처지를 어디다가 변명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이야기라는 게 와닿는다. 극중에서 노현희가 뽕짝가수 녹음에 코러스를 넣는 일을 하는 메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무대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 대사가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더라.
차: 같은 시간대에 하는 <쩐의 전쟁>과 <메리 대구>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다. 둘이 판이하게 다른 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쩐의 전쟁>은 스포츠 신문 만화를 텔레비전으로 옮겨놓은 <장태산> 부류 드라마로, 한국적인 세태 풍자극이고 토착화된 장르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돈이나 사채 등 현실적인 소재를 파고들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메리 대구>는 백수 이야기지만 사실적이라기보다 만화적인 리듬으로 <쩐의 전쟁> 시청자들과 다른 감수성을 지닌 시청자들에게 호소한다.
백: 작품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 과연 10년 전 같으면 이런 드라마의 기획안이 방송사에서 통과됐을까 싶다. 어떻게 보면 허하다고 할까, 실없다고 할까, 딱히 촘촘한 내용을 지닌 드라마도 아니고. 사실 메리와 대구가 슈퍼에서 알바자리 두고 싸우는 걸 보다 보면 초등학교 만화 수준 아닌가?(웃음) 그런데 일본 만화나 드라마의 세례를 받은 세대들이 30대의 나이에 낄낄거리며 좋다고 보고 있는 거다.
다운로드족을 합법적 시스템 안으로
차: 이제는 시장이 커져서 드라마 따라 시청자층도 분화된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났으니 자연스러운 결과다. 여기에 인터넷티브이(IPTV)처럼 보고 싶은 걸 아무 때나 골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시청행태가 바뀐 것도 이런 흐름을 바꿔놓은 큰 이유다.
백: 아이피티브이라는 것도 실은 다운로드족의 시청행태를 합법적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시청방식의 변화는 인터넷상에서 꽤 오래 전부터 바뀌어 온 거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법이나 제도가 너무 늦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 <프리즌 브레이크>만 해도 이제서야 공중파에서 틀기 시작했지만, 이미 ‘석호필’은 케이블이나 인터넷 내려받기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대중적인 패션 브랜드의 모델까지 되지 않았나!
차: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시장으로 바라 보고 그걸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아이튠스가 1.99달러에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를 볼 수 있게 만든 건 물론 사용자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바람직한 수익모델로 연구해 봐야 한다.
백: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10대, 20대가 텔레비전을 떠난다고 걱정하는데 시청행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신경 안 쓰는 거다. 이제 안방에 앉아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보는 건 중·노년층밖에 없다. 공식적인 시청률 집계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젊은층들을 수치화할 수 있으면 시청률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차: 오락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자. <황금어장>의 ‘무릎팍 도사’(맞는 표기는 ‘무르팍’)의 기세가 초반에는 무섭더니 금방 꺾였다.
백: <무한도전>의 ‘무대뽀’ 정신이 확장된 게 ‘무릎팍 도사’고 이것도 <무한도전>처럼 하나의 코너로 시작됐다가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메인으로 컸는데, 그 인기가 에피소드 열 가지를 못 넘겼다.
차: 제작진들도 전에 그런 말을 했다. 프로 특성상 이야기의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무감해질 텐데 강약 조절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런 틀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백: 한국에서 사고친 연예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웃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는 연예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찾지 않나. 표절 시비에 휘말린 이승철이나, 이혼 문제를 거론한 이승환, 공중파에서 오랫동안 퇴출됐던 이영자까지. 그런데 이들만큼 입담 좋게 자기 주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손꼽아 스무명이나 될까?
확 꺾여버린 <무릎팍 도사>
차: 그래도 ‘무릎팍 도사’같은 코너가 나온 건 재미있다. 그 자체로 길게 갈 수 있는 연속성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쇼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 같다.
백: 연속성보다 영향력이 큰 거지. 공중파에서 저런 식으로 한단 말야? 하는 반응이 파생하는 것들이 있다. 또 강호동이라는 진행자(엠시)는 한국 오락 프로에서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씨름선수 출신이라는 배경도 그렇고, 또 게스트들처럼 본인이 비호감이었다가 큰 존재가 됐는데 ‘무릎팍 도사’는 그의 특이한 개성이 잘 맞아떨어진 거다. 그런데 그 약발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벌써 많이 소진됐으니 강호동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차: 강호동이 일종의 변칙 플레이어라면 유재석은 정공법으로 훈련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엠시가 지금 오락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것 역시 드라마가 다양화하는 흐름과 비슷해 보인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화적 토양이랄까 시청자들의 감수성도 다양해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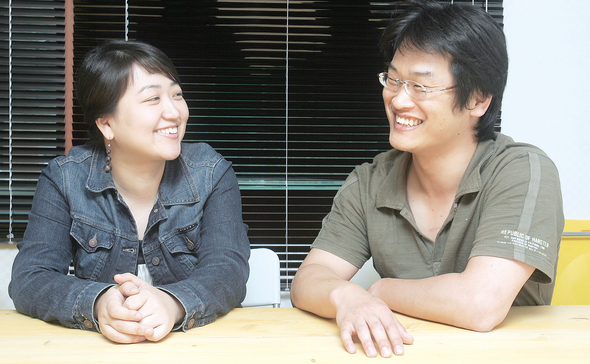 |
|
너 어제 그거 봤어?
|
<최고의 대사>
“넌 자본에 대한 예의가 없는 놈이야!” (<메리 대구 공방전>에서 지현우의 소설을 내고 파산 직전까지 간 출판사 사장이 지현우의 꿈에 나타나 하는 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본’이라는 단어에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무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감각적인 톤으로 쓰니까 통쾌함도 있고 씁쓸함도 있다. 자본이라는 단어를 반어적으로 쓸 수 있는, 역설이 통하는 시대가 온 거다.”(차우진).
“사실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만화적으로 풀어낼 때 설명하기 어려운 즐거움이 있다. 이를테면 ‘자본’ ‘예의’라는 묵직한 단어들이 부딪칠 때 뇌로 오기 전에 소리에서 즉각적으로 생겨나는 재미랄까!”(백은하)
<최악의 게스트>
<지피지기>에서 이영자의 공중파 복귀를 축하하려고 스튜디오에 온 최진실.
“이영자는 단독자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내가 누구랑 친하다는 걸로 인정받는 건 촌스러운 행동인데다 응원 온 최진실을 반복해 보여준 것도 세련되지 못했다.”(백은하)
“인맥이나 학연이 만연한 사회에서 연줄 동원은 오래 되고도 만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걸 자연스럽게 까발리는 건 ‘이 바닥이 원래 이렇다’는 식의 말투처럼 들려 불쾌한 느낌을 줬다.”(차우진)
|
|
|
정리 김은형 기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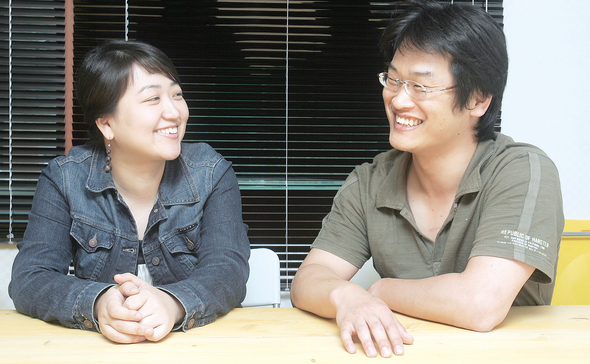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