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75년 4월9일 전투에서 희생당한 타이 정부군 제3보병 대대원 17명을 기리는 동상. 후아이꼰 까오 전적지. 정문태 제공
|
[토요판] 정문태의 국경일기
⑬ 후아이꼰 까오 전적지
 |
|
1975년 4월9일 전투에서 희생당한 타이 정부군 제3보병 대대원 17명을 기리는 동상. 후아이꼰 까오 전적지. 정문태 제공
|
날이 저문다. 타이공산당 푸파약기념관 언덕에서 땅거미 지는 반남리 팟타나 마을을 넋 놓고 바라본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나물 진 늙은이 발길이 바빠진다. 동네아이들 소리가 잦아든다. 하늬바람이 섶나무 냄새를 실어온다. 날벌레가 입으로 달려든다.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제 자리에 있는, 잘 짠 서정시에 나올 법한 시간이다.
두메산골의 낮과 밤 사이는 찰나다. 숨 넘어 가는 빛과 태어나는 어둠 사이, 그 가느다란 태초의 접선에 감탄할 틈도 없이 이내 온 누리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어둠은 떠돌이 인생에게 떠나야 할 때를 알리는 신호다. 울퉁불퉁 샛길 1307을 따라 지방도 1801과 맞닿는 삼각 교차로까지 기껏 17㎞를 달리는 데 꼭 1시간이 걸린다. 샛길 1307을 벗어난 해방감은 곧장 낯선 길과 실랑이로 이어진다. 집도 사람도 이정표도 없는 삼각지에서 1801을 따라 마냥 북으로 달린다.
전선의 공포를 달래준 ‘사하이’
“혁명가는 몸뚱이가 죽을지언정 두려워 않는다/ 인민의 기쁨과 영원한 이념 앞에 삶을 바친다/ 붉은 피가 땅을 적시고 꽃과 산이 울부짖는다/ 이름 없는 명예는 오직 인민들 가슴에 남는다/ 산처럼 담찬 신념과 눈빛에 하늘도 땅도 움츠린다/ 앙갚음, 한 명이 죽으면 십만이 태어날 것이다/ 동지를 위한 앙갚음, 인민을 위한 끝없는 투쟁/ 머잖아 붉은 깃발이 온 도시에 휘날릴 것이다.”
불빛 하나 없다. 칠흑 같은 1000m 국경 산길을 달리며 ‘사하이’(동지)를 듣고 또 듣는다. 진 깜마촌이 만든 이 타이공산당 노래는 한 때 전사들의 혼이었다. 러시아 행진곡조로 시작해서 타이 전통 서정풍으로 흘러가다 웅변조로 마무리하는 이 가락이 전선 노래로 썩 어울린다고 여긴 적은 없지만, 노랫말만큼은 시대의 연민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공산 게릴라 물리친 장소로
40㎞ 달리는 동안 마주친 차량 없어
아직 살아있는 국경 이념분쟁 공포
1965~83년 공산당 3415명 희생
타이 이념분쟁 희생 동남아 최대
미·중·베트남·캄보디아 등 개입
미국은 25년간 10억 달러 뿌려
“타이 사람끼리 죽이며 생채기”
안팎이 암흑인 자동차에서 도돌이표를 누르는 짓 말고 할 거리도 마땅찮았고, 어쩌면 그보다 노래에 잠겨 어둠의 공포를 잊고자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사하이’는 내 상상력을 데리고 시대를 넘나들었다. 1970년대 이 산악전선을 달리던 타이공산당 전사들도 공포를 떨치고자 ‘사하이’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올랐던 전선은 다 그랬다. 전선에서 노래는 공포를 다스리는 통과의례였다. 하나가 부르면 이내 열이 되고 백이 되는 전선 노래는 아주 센 집단중독성을 지닌 전투용 마약이었다. 폭탄 소리에 놀라 아랫도리가 젖었던 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새내기도, 겁에 질려 마구잡이 총질을 해대던 자유아체운동(GAM) 초짜도 모두 전선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프로페셔널 전사로 거듭났다. 그리하여 전선에서 노래는 이념이고 신앙이고 희망이고 삶이었다. 다른 말로 노래는 투쟁이고 해방이었다.
“태평이네.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운전대를 잡은 통역이 근심스레 힐끗 쳐다본다. “가다 보면 사람 사는 동네 나오겠지.” 대꾸가 시원찮다고 여겼는지 통역은 ‘사하이’에 끼어들어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노랫말이 좋긴 한데, 사연을 모르니.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지방도 1801에 올라 라오스와 국경을 맞댄 반후아이꼰으로 가는 23㎞는 비록 깜깜하고 꼬불대는 산길이지만 샛길 1307에 견주면 낙원이다. 적어도 반듯하게 닦은 길바닥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갓 8시를 넘긴 초저녁인데 이렇게 사람 없는 길은 처음이다. 반남리 팟타나에서 반후아이꼰까지 40㎞를 1시간45분 동안 달리면서 마주친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다.
 |
|
공산당 게릴라 200명의 공격을 막아낸 제3보병대대 작전 사령부 참호. 후아이꼰 까오 전적지. 정문태 제공
|
마감하는 식당에서 부랴부랴 저녁을 때운 9시40분, 반후아이꼰 옛 중심지인 반후아이꼰 까오는 병원 하나를 빼면 암흑천지다. 첫 번째 찾아간 호텔은 불이 꺼졌다. 두 번째 호텔은 자동차 소리에 불이 켜졌다. 잠옷 바람으로 나온 주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반남리 팟타나에서 지금 오는 길이라고? 형편 되면 이 동네 밤길은 안 다니는 게 좋은데.” “왜, 무슨 사고라도?” “그런 건 아니지만, 국경지역인데다 옛날부터 다들 위험하다고.” 초저녁부터 반남리 팟타나-반후아이꼰 산길에 자동차가 없었던 까닭이다. 분쟁의 잔상이 아직도 국경에 살아있다는 뜻이다.
국경 이념분쟁은 40~50년이 지나도록 여태 타이 사회를 옭매는 전설로 뻗어 내리고 있다. 현대사를 감추면서 가르치지 않는 타이 정부와 공식 해체 선언마저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타이공산당의 합작품이다. 그동안 타이공산당 연구자들 단골메뉴가 내분 비판이었지만, 사실은 타이공산당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역사적 무책임이었다. 한 마디 말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그 상징이다. 이건 타이공산당이 동지의 피를 헛되게 했을 뿐 아니라, 역사를 전설거리로 팽개쳐버렸다는 뜻이다. 1990년대 말부터 ‘월든 벨로’류 학자와 언론인이 타이에 정변이 생길 때마다 걸핏하면 들이댔던 ‘인민무장봉기설’이니 ‘내전설’ 같은 아주 비과학적인 희망논리나, 호텔 주인이 말하는 ‘위험한 국경 밤길’이 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전설이다. 자취도 없는 타이공산당에 줄기차게 따라붙는 흑책질도 희망질도 모두 현실이 아닌 별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1975년 4월9일 새벽의 총성
새날이 밝았다. 4월 땡볕이 쪼아대는 호텔 마당에서 개미떼를 바라보며 뜸 들인다. 통역은 일찌감치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여행을 하다보면 신나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괜한 의무감을 일으키는 거북스런 곳들이 있다. 내겐 박물관이니 전시관이니 기념탑 같은 영혼 없는 인공물들이 그래서 별난 사연이 없는 한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해 다닌다. 타이-라오스 국경지역 공산당 마을들을 둘러보는 이번 여행에서 정부군 쪽 자취도 찾아보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정작 전적지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까닭이다. “바로 뒷동산이야. 자동차로 2분이면 돼.” 호텔 주인이 눈치를 챘는지 한 마디 거드는 통에 떠밀리듯 길을 나선다.
말 그대로 반후아이꼰 까오 한복판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었다.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이 전적지는 본디 타이군 제3보병대대 작전사령부였다. 지금은 그저 기념관 안내와 관리를 맡은 홍보병 예닐곱이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고 어슬렁거릴 뿐이다. 사무실 군인은 아침 일찍 찾아온 이방인에 시큰둥하더니 한국 기자라는 통역 말에 다짜고짜 홍보용 비디오를 튼다. 기겁해서 손사래치고 자리를 뜨니 이번에는 따라나선다. 희생자 추모 동상을 거쳐 옛날 총과 군복 따위를 늘어놓은 초라한 기념관을 둘러본 뒤, 기지를 삥 둘러친 참호에 선다. 근데 여긴 도무지 사람들이 찾아올 곳 같지가 않다. 전적지 간판마저 땅바닥 한구석에 팽개쳐놓은 판에 타이 정부가 선전해온 교육현장으로 관광지로 먹힐지 의심스럽다.
이 전적지는 타이공산당 무장투쟁이 한창 달아오르던 1975년 4월9일을 가리킨다. 그날 공산당 게릴라 200여명이 이 타이군 제3보병대대 사령부를 습격했다. “새벽 4시쯤 총소리가 났다. 철모와 총을 챙겨 나서자 이미 병영 곳곳에 총알이 날아들었다. 참호에서 싸우던 나는 공산당이 던진 M26 수류탄에 맞았고, 얼마 뒤 헬리콥터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탐롱 똔행 일병의 수기처럼 이 전적지는 정부군 69명이 17명 전사자를 내면서 작전사령부를 지켜낸 영웅적 전투를 기린다.
 |
|
하루 400여명이 오가는 한적한 후아이꼰 국경 건널목. 반대쪽이 라오스의 무앙 응은이다. 정문태 제공
|
그즈음 타이 정부는 13만 군에다 5만 경찰과 민병대를 거느렸으나 공산당 게릴라 1만2천명을 못 당해 곳곳에서 밀려났다. 해서 타이 정부는 장제스의 국민당 잔당 3천을 용병으로 투입한데 이어 마을 자경단까지 전선에 올렸다. 그럼에도 군과 경찰 희생은 갈수록 늘어났다. 1969년 300명, 1970년 450명, 1971년 700명으로 점점 불어나면서 1983년까지 해마다 어림잡아 500명 웃도는 전사자를 냈다. 반대쪽 타이공산당은 1965~1983년 사이 3415명이 희생당했다. “우리 쪽 전사자는 1천여 명이었고, 나머지 2천 웃도는 이들은 가족을 비롯한 비무장 당원들이었어. 정부군은 희생자를 또렷이 밝힌 적 없지만, 적어도 1만은 넘을 거야.” 모댕(붉은 의사)이라 불린 공산당 전선 의사 툰사왓 욧마니반폿(69) 말이다.
그 시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전역이 인도차이나전쟁에 휩쓸린 탓에 타이가 묻혔을 뿐, 병력 투입이나 기간이나 희생자 수를 놓고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념분쟁이었다. 게다가 타이 분쟁 속살엔 국제 대리전이 숨어 있었다. 타이공산당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이 뒤를 받쳤고, 타이 정부는 미국과 타이완 지원을 받았다. 특히 미국은 1951~1976년 사이 최대 10억 달러를 타이 정부 반공작전에 뿌렸다. 그 시절 환율을 요즘 가치로 치면 5~10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미국 중앙정보국 문건 ‘타이공산주의 분쟁’(1991년 비밀 해제)에 따르면 1966년 육군 6398명과 공군 1만7789명을 포함한 미군 2만4470명이 타이에 주둔했다. 타이공산당이 1972년 우따빠오와 우돈의 미국 공군기지를 공격하며 미국을 주적으로 선언했던 까닭이다.
타이를 무대로 펼쳐진 국제 대리전
“같은 동전을 서로 다른 면만 쳐다본 타이 사람끼리 죽이며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우리 모두는 조국 타이를 사랑했다.” 전적지를 나와 라오스와 마주 본 후아이꼰 국경 건널목까지 5㎞를 달리는 동안 제3보병대대 전투에 휘말렸던 아라따뽄 삔수파 병장 말이 따라 붙는다. 정부군과 공산당 전사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시대적 운명이었다 치고, 조국 타이는 사랑만 받았지 어느 쪽에도 베풀지 않았다는 게 역사의 모순이 아닌가 싶다. 인류사에 가장 지독하고 오래된 이 짝사랑을 끝낼 때도 되었다. 시민한테 조국을 사랑하라고 우길 테면, 조국은 마땅히 그 시민을 보호해야 옳지 않겠는가. 질기게도 인류를 물고 늘어져온 조국 신화는 타이-라오스 국경 두메산골에도 어김없이 뿌리내렸다.
※필자의 요청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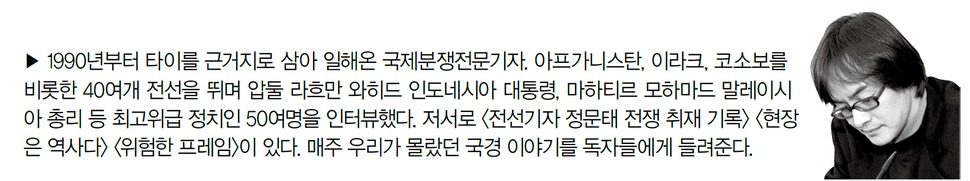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