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8 11:25
수정 : 2018.06.28 12:13
1.
백종현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썼다가 스스로 철회한 구절에 나오는 그 “누구”는 바로 나이다. 백 교수가 김상봉의 이름을 거론한 것과 달리 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나로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잘 모르겠다. 하기야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랴. 칸트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가 이충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백 교수는 그 “누구”의 “한국어 능력이나 독일어 어휘 능력 수준, 그리고 고전 번역의 자세”를 비난했다. 앞의 두 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번역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하는 번역자의 제1 덕목은 전문성이다. 김상봉의 말을 그대로 옮겨 말하자면 “번역자로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곧 전문성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잘못 알고 잘못 옮긴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평생 번역을 멀리했다.
2.
한국칸트학회가 기획한 <칸트전집> 번역 사업에 나는 번역자로서 참여했다. 내게 주어진 텍스트는 <법론>(Rechtslehre)이었다. 이 텍스트는 법(Recht)에 관한 이론(Lehre)이므로, 이 텍스트의 번역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당연히 독일어 ‘레히트’(Recht)의 번역이다.
우리말이나 영어와 달리 독일어 ‘레히트’(Recht)’는 ‘법’(law)과 ‘권리’(right)라는 상이한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론>에 등장하는 ‘레히트’(Recht)가 ‘법’인지 아니면 ‘권리’인지는 오직 전후 문맥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다른 독일어 텍스트에서도 다를 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법론>을 번역하고자 하는 번역자는 모든 ‘레히트’(Recht)를 매번 ‘법’ 또는 ‘권리’로 구분해서 옮겨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어느 번역자가 ‘레히트’(Recht)를 ‘법’이나 ‘권리’가 아니라 ‘법/권리’로 옮긴다면, 그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과 그 문장이 등장하는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오직 백종현만이 ‘레히트’(Recht)를 ‘법/권리’로 옮기고 있다.
3.
사실 ‘레히트’(Recht) 번역의 문제는 영역본이나 일역본만 참조해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문자 ‘레히트’(recht)의 번역이다.
<법론>에서 소문자 ‘레히트’(recht)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론’의 §C이다. 칸트 자신이 “법의 보편적 원리”라고 이름 붙인 문장이니,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Eine jede Handlung ist recht, die (…).”(이하 ‘칸트 원문’)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die) 이후의 문장을 제외하면, 이 문장은 ‘주어+동사+술어’로 구성된 지극히 단순한 문장이다.
이것을 백종현은 “(…)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이하 ‘백종현 번역문’)라고 옮긴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종현 번역문’은 네 개의 상이한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① 각 행위는 법적이다. ② 각 행위는 권리가 있다. ③ 각 행위는 정당하다. ④ 각 행위는 옳다.
‘백종현 번역문’ 앞에서 독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물론 독자의 탓이 아니다. 그것은 ‘칸트 원문’의 번역을 독자에게 떠넘긴 번역자의 탓이다. 번역자는 사실상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위한 네 개의 선택지를 독자에게 제공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②는 비문이니 그나마 세 개뿐이다.
4.
번역자의 직무유기는 번역자의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듯이 보인다. <법론>의 번역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레히트’(recht, 올바른), ‘레히틀리히’(rechtlich, 합법적), ‘게레히트’(gerecht, 정당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칸트 용어로 말하자면, ‘레히트’(recht)는 형식적으로 공존가능한 외적 행위에, ‘레히틀리히’(rechtlich)는 형식적으로도 질료적으로도 공존가능한 외적 행위에, ‘게레히트’(gerecht)는 형식적으로도 질료적으로도 공존가능한 것임이 제3자(법정)에 의해 인정된 외적 행위에 붙여지는 술어이다. 제도론의 언어로 말하자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기 다른 원리와 권한을 가지고 행위를 규정하며, ‘레히트’(recht)’, ‘레히틀리히’(rechtlich), ‘게레히트’(gerecht)는 바로 그러한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번역자 백종현은 전혀 모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레히틀리히’(rechtlich, 법적)가 문맥에 따라서는, 위와는 달리, ‘모랄리쉬’(moralisch, 도덕적)와 대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그의 비전문성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그의 비철저함의 원인이기도 하다. 가령 <법론>에 등장하는 ‘레히텐스’(rechtens), ‘레히츠매시히’(rechtsmaessig), ‘데스 레히츠’(des Rechts)’ 등은 ‘레히트’(recht) 번역의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데, 그러한 인접 용어들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백종현의 번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5.
다른 부분을 아무리 훌륭하게 옮긴다고 해도 대문자 ‘레히트’(Recht)와 소문자 ‘레히트’(recht)를 잘못 옮기는 사람은 결코 칸트의 <법론>을 번역할 자격이 없다. 번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텍스트를 번역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 번역은 ‘구글링’이 아니다.
(백종현이 언급한 ‘지테/지텐 Sitte/Sitte’에 관해서도 곧 글을 쓸 예정이다. 물론 학회장이 아니라 번역자로서 말이다.)
※ 이충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헤겔 철학 연구로 석사,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칸트 법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한성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친다. 철학을 삶의 유일한 방식으로 삼은 후 사회철학, 윤리학, 환경철학 등 실천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문제는 그의 또 다른 지적 도전이 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일 철학자들과의 대화>, <이성과 권리>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법이론>, <쉽게 읽는 칸트: 정언명령>, <헤겔 정신현상학>이 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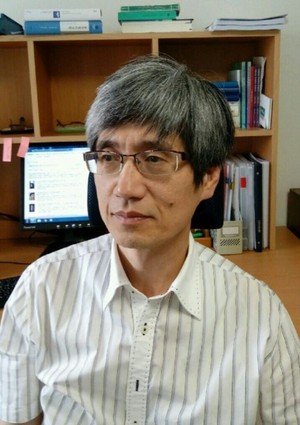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