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5 10:21
수정 : 2019.10.15 10:36
 |
|
수명이 거의 다 된 소 한 마리와, 그 소와 함께 30년을 보낸 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며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 <워낭소리>는 한국 독립영화의 상업적 가능성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74)워낭소리
감독 이충렬(2009년)
 |
|
수명이 거의 다 된 소 한 마리와, 그 소와 함께 30년을 보낸 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며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 <워낭소리>는 한국 독립영화의 상업적 가능성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산업적 관점만 놓고 볼 때, 한국의 다양성 영화 혹은 독립영화는 <워낭소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9년 1월 그 시작은 미약하게 개봉된 이 영화는 이후 입소문을 타고 점점 창대해져 3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존재하긴 했지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독립영화는 비로소 ‘흥행 사례’를 만들어냈고, 다큐뿐만 아니라 극영화도 <똥파리>(2009)를 필두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0년 전 <쉬리>(1999)가 주류 상업영화의 파이를 늘렸다면, <워낭소리>는 그 반대편에서 파이를 확장한 셈이다.
<워낭소리>가 이러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건, 이 영화가 지닌 보편적인 힘 때문이다. 수명이 거의 다 된 소 한 마리와, 그 소와 30년을 함께한 노인. <워낭소리>는 이렇다 할 서사 없이 노인과 늙은 소가 같이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들을 이어간다. 소에게 사료를 먹이지도 않고, 농사지을 때 기계나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는 노인에게 소는 친구이자 동료이며 노동의 수단이자 자식 같은 존재다. 다큐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소를 팔라”고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소와 함께하고 결국 장례까치 치른다.
<워낭소리>는 흐뭇하고 한적한 농촌 다큐가 아니다. 노인과 소에게 평생 낙인처럼 찍혀 있는 노동의 흔적, 늙고 병들며 아픈 육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농사일… 이 작품은 그 심각한 현실에서 파트너로서 오롯이 한길을 걸어가는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다루며, 그 풍경들은 우리가 잃고 살았던 정서를 환기하고 결국은 거대한 울림을 준다. 극영화에서 <집으로…>(2002)가 거두었던 성취를 다큐에서 <워낭소리>가 거둔 셈이며, 이것은 고도의 도시화를 겪던 2000년대의 관객들에겐 심금을 울리는 체험이었다. 일종의 정신적 고향에 대한 감정적 자극이었던 셈. 그리고 5년 뒤 어느 노부부에 대한 기록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가 약 480만명의 관객으로 <워낭소리>를 넘어섰다.
김형석/영화평론가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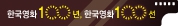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