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3 07:13
수정 : 2019.09.04 13:30
 |
|
막노동꾼 영달, 출옥수 정씨, 술집 작부 백화는 10년 만에 간다는 정씨의 고향 ‘삼포’를 향해 함께 눈밭을 누빈다.
|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55)삼포 가는 길
감독 이만희(1975년)
 |
|
막노동꾼 영달, 출옥수 정씨, 술집 작부 백화는 10년 만에 간다는 정씨의 고향 ‘삼포’를 향해 함께 눈밭을 누빈다.
|
1975년 4월13일, 영화감독 이만희가 죽었다. 그때 그는 <삼포 가는 길>의 편집을 아직 마치지 못했다. 한번 더 불러보고 싶다. 이만희. 나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김기영, 유현목, 김수용, 임권택, 하길종으로부터 직접 그 이름을 들었다. 누군가는 감탄을, 누군가는 탄식을,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똑같은 조건의 한국영화라는 상황에서 이만희는 마치 다른 우월한 예술가인 것만 같은 장면을 연출해냈고, 그렇게 하고만 싶으면 일찍이 한국영화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을 창조해냈다. 물론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단 해내기만 하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누구도 가닿아보지 못한 세상과의 감응을 펼쳐 보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만희는 그때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었다. 그 시기 그의 영화는 대부분 믿을 수 없을 만큼 나빴다. 한국영화는 이중의 검열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관객들은 극장을 떠났다. 이만희는 황석영의 동명 단편소설의 설정만 가져와서 각색을 했다. 을씨년스러운 한겨울의 시골, 공사판을 떠돌던 막노동꾼 영달(백일섭)은 주막에서 형무소를 나와 고향을 찾아가는 정씨(김진규)를 만난다. 주막 주인은 돈 떼먹고 달아난 작부 백화(문숙)를 잡아다 주면 섭섭지 않게 사례하겠다고 제안한다. 두 남자는 눈밭의 길에서 백화를 만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셋이서 역까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바꾼다. 눈 덮인 논두렁길. 이따금 마주치는 시골 마을. 어떤 향수,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세 사람은 역에 도착한 다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다시 떠난다. 길의 영화. 길 위에 선 영화. 길 위에 선 삶. 길 위에 선 우리. 우리가 잃어버린 길. 우리가 잊어버린 길.
<삼포 가는 길>은 이만희의 가장 좋은 순간과 가장 나쁜 장면이 함께 있는 영화다. 실패한 걸작. 그러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 영화에는 한국영화의 가장 좋은 감정과 가장 나쁜 대목이 함께 있다. 부서져버린 한국영화. 말 그대로 파국의 알레고리. 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아무도 두번 다시 <삼포 가는 길>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정성일/영화평론가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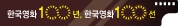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