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3 06:00
수정 : 2020.01.03 10:38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윤리적 도시설계’ 화두로 종횡무진 지적 탐구
중앙집권·타자화된 ‘닫힌 도시’ 아닌 모호하고 복잡한 ‘열린 도시’ 지향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
리처드 세넷 지음, 김병화 옮김/김영사·2만2000원
민권운동이 한창 타오르던 1960년대 중반, 미국 보스턴 구역의 노동계급 거주지에 새 학교를 짓기로 했다.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인종 통합학교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흑백 분리 학교를 만들 것인가? 통합학교를 만들려면 멀리 사는 흑인 아이들을 위해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큰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다. 백인 부모들은 마을에 녹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학교를 반대했다. ‘진보적 양심’을 지닌 도시전문가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도시계획가는 지역 주민들이 고수하는 사회의 기존 가치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정의를 물리적 공간으로 재현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근본적 질문. 윤리적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
2016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칠레의 ‘사회 참여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킨타 몬로이 공동주택단지. 각 세대에 돌아가는 정부의 건축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그는 절반만 완성된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벌이가 나아지면 스스로 증축·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라베나는 “진정한 설계란 사람들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영사 제공
|
노동과 도시연구로 저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짓기와 거주하기>는 이런 물음에서 출발한다.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기술’의 가치를 역설한 <장인>(The Craftsman·2009), 사회적 협력 방식을 도모하는 <투게더>(Together·2013)에 이어 2018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그가 오래 천착해온 주제인 ‘호모 파베르 프로젝트’ 3부작의 완결편이다.
짓기-거주하기를 구분할 때 그가 빌려온 개념은 물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빌’(ville)과 특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행동이 담긴 ‘시테’(cite)다. 도시가 건설되는 방식(빌)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방식(시테)은 불일치할 때가 많다. 다양한 인종과 계급,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는 이해충돌적이며 전문가에 의한 물리적 개선이 곧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넷은 빌과 시테의 불일치성이 도시(공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빌과 시테의 균형을 찾아나가려는 전문가와 거주민들의 노력 속에서 도시의 윤리성을 발견한다. 그는 빌만 챙기면 시테가 좋아질 것이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원대한 ‘빛나는 도시’ 이론과 ‘국제주의 건축양식’에 반대하며, 식당·게임실·의무실·휴게공간·사무실 등을 모두 한 건물에 몰아넣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뉴욕의 ‘구글플렉스’가 얼마나 ‘비도시적인지’ 고발한다. 스마트시티를 내세우며 데이터의 중앙집권화를 꾀한 인천 송도 신도시는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유령 도시”라고 일갈한다.
그가 지향하는 ‘열린 도시’는 역동성·애매모호함·복잡성·의외성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며 정보의 소통과 인간적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고, 거주민들이 불확실함 속에서 기민한 태도를 익힘으로써 책에선 배울 수 없는 지혜를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비판하는 동시에 본인이 만드는 것에도 자기 비판적”이어야 한다. 앞서 말한 보스턴 학교를 인종 통합 배움터로 만들면서도 시간대에 따라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세넷은 상상해본다.
각종 분야를 종횡무진하는 학문적 깊이도 놀랍지만, 뇌졸중으로 방향감각에 손상을 입었으면서도 이를 감각의 확장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열린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다. “회복하는 동안 건물과 공간의 관계를 전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공간에 더 광범위하게 적응하게 되었다. 로버트 벤추리가 말하는 (의미의 명료함보다 풍부함을 지지하는) 진짜 도시인이 된 것이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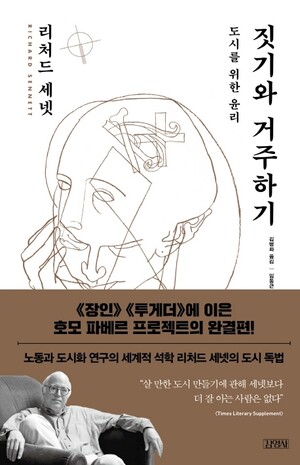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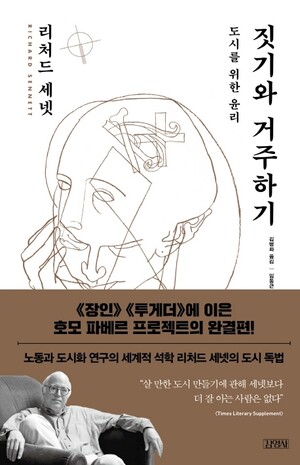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