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31 09:59
수정 : 2017.02.08 11:11
“배터리 자체 결함 탓” 발표 뒷말 무성
왜 생겼고, 어떻게 걸러지지 않고 장착됐나?
협력업체 문제제기 삼성이 묵살됐을 가능성은?
“왜·어떻게에 대한 검증 없어 재발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가 설 연휴 전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이상 발화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 탓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기기 20만대와 배터리 3만개로 진행한 대규모 충·방전 시험에서 발화 현상이 재현됐고, 해외 전문기관들의 분석 결과도 배터리 결함 탓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 쪽은 갤럭시노트7을 화제로 삼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이다. “옛날 일을 갖고…”라며 면박을 주기까지 한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갤럭시노트7을 지우는 게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언론 등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게 하고, 공항 곳곳에 붙어 있는 ‘갤럭시노트7 휴대 금지’ 안내문도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 같은 후속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기의 결함이나 오작동 등과 관련해서는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찾아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상 발화 원인은 앞부분이 잘려져 있어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출신과 협력업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선 삼성전자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 탓이라고 할 뿐, 배터리가 왜 그런 결함을 갖게 됐는지와 그런 배터리가 어떻게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반성이 없다.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에스디아이(SDI)와 중국의 에이티엘(ATL)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휴대전화 배터리를 만들어왔고, 지금도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 발표대로라면, 두 업체의 스마트폰 배터리 생산라인은 즉각 멈췄어야 한다.
배터리의 크기 대비 성능을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높인 것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리적인 특성상 매우 불안정하다. 강아지가 무는 정도의 충격에도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곤 한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설계할 때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일정 범위의 ‘안전지대’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 설계 과정에서 크기 대비 용량을 너무 높이면 안전지대가 줄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텐데, 삼성전자 발표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 다만, 배터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는 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7’ 출시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출시를 서둘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래전략실이 갤럭시노트7으로 대박을 터트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은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랑 일하기 싫다는 뜻이죠’라며 갈아치우고, 내부 개발팀 사이에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른바 ‘스피드’를 강조하는 방식인데, 이런 문화의 병폐가 쌓여 이번 사태를 빚었다는 분석이 많다. 스피드 중심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없이는 후속 제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를 서둘러 회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배터리 충전을 강제로 15%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들에게 ‘채찍’까지 휘둘렀는데, 이 부분에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법적 근거도 없다. 기업이 고객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례도 없다. 소비자 쪽에서는 용납할 수도, 쉽게 잊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아직 갤럭시노트7 이상 발화 원인을 ‘깨닫지는’ 못한 모습이다.
jskim@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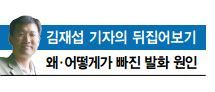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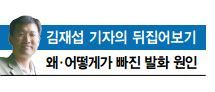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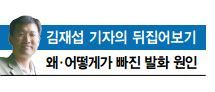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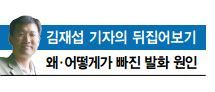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