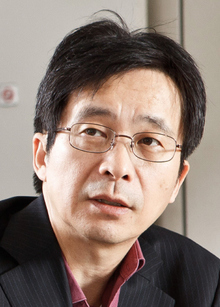 |
|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통계학 원리로는 단 몇백명만으로도 몇천만명의 생각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를 맞춰야 한다. 첫째는, 유권자 이름을 모두 적어 넣은 상자에서 눈을 감고 하나씩 뽑아 수백명의 샘플집단을 만든 뒤 빠진 사람 없이 이들 모두에게 답을 얻어야 한다. 즉, 누구든 샘플이 될 확률이 똑같아야 한다. 둘째는,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을 즉, 누구를 찍을지를 정확히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조사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 집전화로만 조사할 경우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 20% 정도의 가구가 조사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주로 진보적 성향일 젊은층이다. 쉽게 확보된 40~60대가 전화를 받으면 질문을 멈추고, 인구 비례에 맞춘 20·30대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다 보면 ‘일반적인 20·30대’가 아니라 ‘외출하지 않고, 집전화를 받는 20·30대’라는 특정 집단의 생각이 과대 대표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근 들어서 휴대전화도 활용하지만 이것은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전국단위가 아닌 선거구 단위 조사에서는 쓰기 어렵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화를 끊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속성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100명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응하는 사람은 자동전화조사는 5명, 집전화는 15명, 휴대전화는 5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응답자가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의도적으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여당 편향적 결과의 원인이다), 실제로 투표장에 갈지 안 갈지, 가서 누구를 찍을지 모르면서 대답하는 경우도 많다. 30% 정도는 아예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이 또한 여 편향적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여론조사는 유권자 중 특정한 속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통계적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결과를 놓고 표집오차나 신뢰수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표집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이중 무지’이다. 표집오차 ± 4%에 ㄱ 후보가 37%, ㄴ 후보가 32%를 얻었다면 실제 지지율은 ㄱ 후보가 33~41% 사이의 어떤 수치이고, ㄴ 후보는 28~36% 사이의 어떤 수치라는 뜻이다. 실제는 ㄱ이 33%, ㄴ이 36%일 수 있다. “표집오차 내에서 우세”라는 말도 틀리다.
‘여론’은 무시한 채 어설픈 ‘여론조사’에 열심을 내 선거를 왜곡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미디어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정치권도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선거 후보자를 뽑는 것을 재고해야 하겠다(가위바위보가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 여론조사는 그것을 반복할 경우에 한해 ‘대략적인 의견의 변화 방향’은 알려줄 수 있다. 더 겸손한 해석과 활용을 바란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