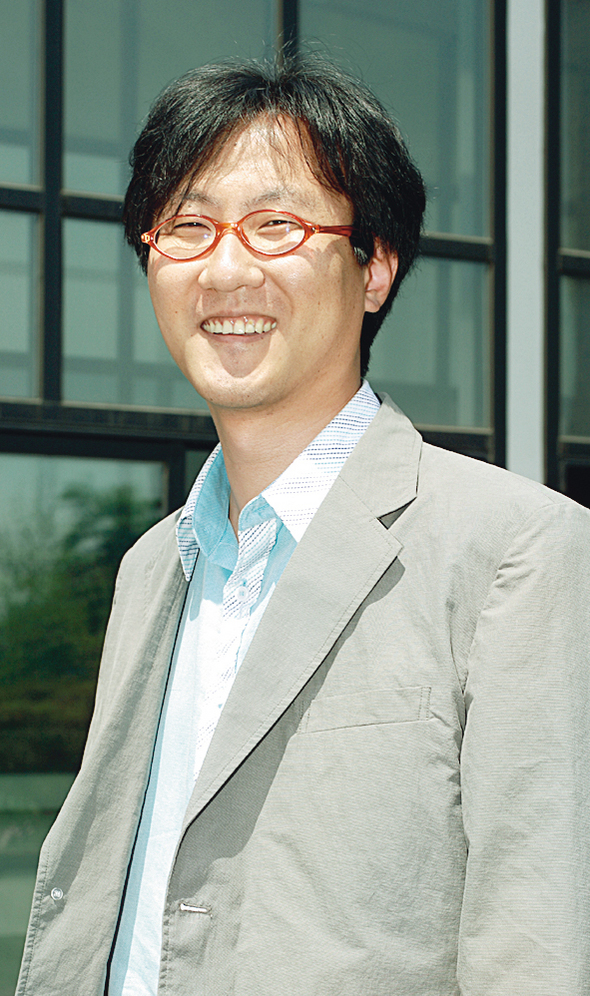 |
|
남종영 사회정책팀 기자
|
한겨레프리즘
“이 옷의 비밀이 뭔지 알아? 이 옷은 우릴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켄 로치 감독의 2002년 영화 <빵과 장미>에 나오는 한 빌딩 청소부는 이렇게 말한다. 파란 청소복을 입은 청소부의 이 대사는 나에게 작은 충격을 일으켰는데, 순간 어느 대학 남자 화장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어느 학생이 매직으로 써서 소변기 위에 붙여 놓은 것이었다. ‘청소 아주머니도 여성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청소 작업복은 마술적인 옷이다. 청소 아주머니가 일반인의 옷을 입을 때, 그들과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성과 남성, 아주머니와 학생으로 이어지지만, 청소 작업복을 입는 순간 이런 ‘인격의 관계’는 사라지고 자본주의적 분업 관계 속으로 편입되고 만다. 청소 아주머니들은 다른 행동 지침도 요구받는다. 이를테면 대기업으로부터 예산의 ‘껌값’ 정도를 지급받는 청소용역업체는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화물 엘리베이터를 탈 것’. 놀이공원의 청소 아주머니들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우고 사라져야 한다. 만약 아주머니가 봄볕에 취해 빗자루를 놓고 앉아 쉰다면, 분명 관리자의 잔소리가 날아올 것이다. 우리의 눈도 그들의 시각적 정보를 배제하도록 사회적으로 진화한 것 같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편한 것은 피하려는 사회심리적 기제가 작용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들은 투명인간처럼 산다. 지난 1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체육관을 메운 전국의 노조 대표들은 하나같이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발기로 짧게 깎은 머리, 불끈 쥔 주먹이 새겨진 조끼, 걷어붙인 소매와 기름때가 낀 운동화 … 대학시절, 노동절 집회에 따라가 본 모습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낯설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었다. 그들은 정통 노동자 복장을 입지 않았다. 투명인간 청소복도 아니었다. 화사한 색깔의 재킷, 재킷에 달린 브로치, 토트백과 굽 낮은 구두. 그들은 한껏 차려입고 대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위원장 선거를 마치니 밤 8시가 넘었다. 남은 건 비정규직법 개악과 관련한 ‘5월 투쟁 방침’ 안건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지체돼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빈자리가 많아졌다. 울산의 대공장에서 온 확성기 달린 승합차도 자리를 떴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몇 해 전, 청소 아주머니들의 작업 환경을 취재할 때 만난 아주머니, 아니 여성연맹 위원장이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청소노동자의 절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건에 최저임금법 관련 투쟁을 포함시켜 속히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투표로 가결해야 투쟁에 힘이 붙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무작정 총파업을 선언해놓고 조합원들을 추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지루한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대의원대회를 빠져나왔다. 88체육관에서 1㎞는 족히 되는 지하철역에서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도란거리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들을 여고 동창회를 갓 파한 아주머니들로 여겼을 것이다. 위원장은 나에게 다가와 최근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잠시 딴생각을 했다. 아주머니들은 대의원대회에 같이 있었던 걸까, 혹시 그들은 설마 민주노총의 타자가 아니었을까.남종영 사회정책팀 기자fandg@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