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9 09:34
수정 : 2019.12.19 14:52
김보통의 해 봤습니다
충북 괴산에 갔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약 두 시간을 달리다 국도로 들어서자마자 도로 위에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이 보였습니다. 크기가 제법 큰 것이 노루 새끼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덩치가 꽤 컸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온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지나쳤습니다. ‘덜컹’하며 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미안했습니다.
“그거 뉴트리아예요.”
괴산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근처 농가에서 모피를 쓴다고 들여왔는데. 이게 수요가 없으니까 다 산에 풀어버렸대요. 원래가 더운 나라에 살던 짐승이라 겨울이면 싹 얼어 죽을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얘들이 그걸 적응을 해버렸어요. 게다가 설치류잖아요. 그래서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거죠. 지금 온 산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차에도 많이 치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컸던 거군요.”
저는 새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수입해 들여온 동물이고, 큰 쥐고, 그래서 개체 수가 적지 않다는 얘기에 미안함이 사라지거나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뉴트리아의 처지가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보니 남의 의도로 쓸모가 정해졌습니다. 그 쓸모에 의해 살던 곳에서 멀어졌고, 낯선 환경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가죽이 벗겨진 채 죽임당하는 것이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쓸모가 없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이 순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새로운 포식자들. 그리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를 오가야 하는 나날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피가 인기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일정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자리를 주최한 분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맡은 직책과 임무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이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이제야 마음껏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홀가분하면서도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는 그의 눈동자는 마냥 기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튜버라도 하시죠.” 제 실없는 소리에 일동은 “하하하” 웃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젠가부터 라디오도 나오지 않아 고요한 차 속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원치 않는 쓸모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뉴트리아와 삶 대부분이 쓸모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무위로 인해 생긴 자유 앞에 불안해하던 그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쓸모를 찾기 위해 지난 6~7년간 되는대로 살아왔던 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길은 이미 해가 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속도를 늦춘 채 조심히 앞을 살피며 가고 있노라니 뉴트리아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다른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밟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그림 김보통(만화가)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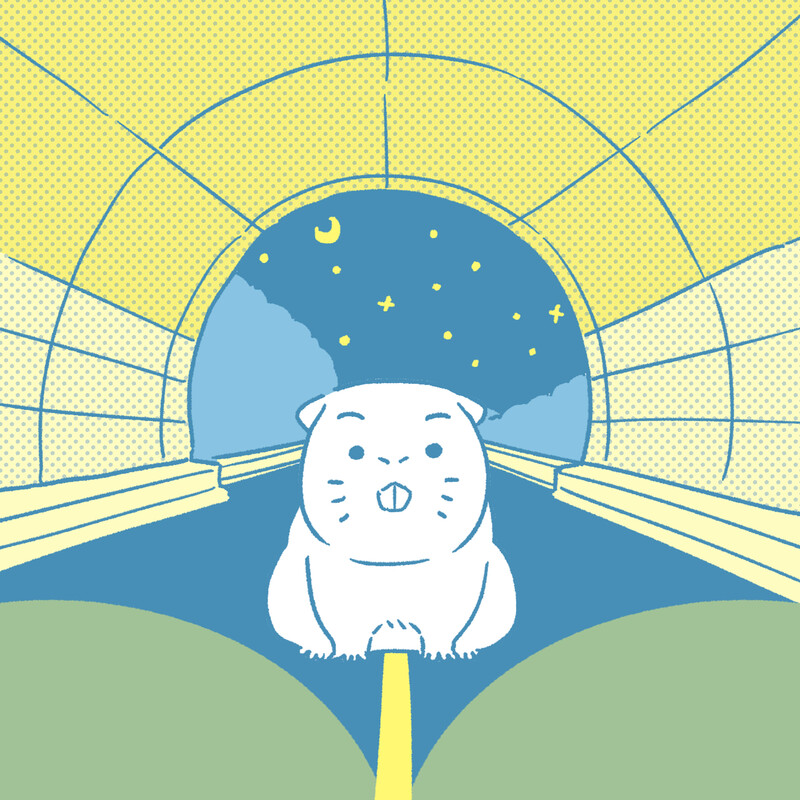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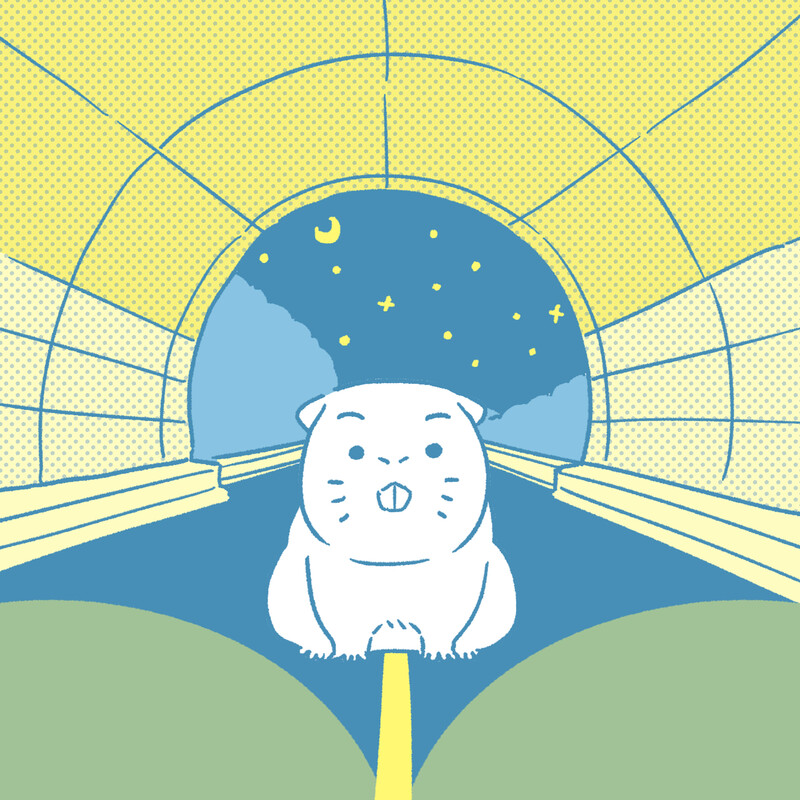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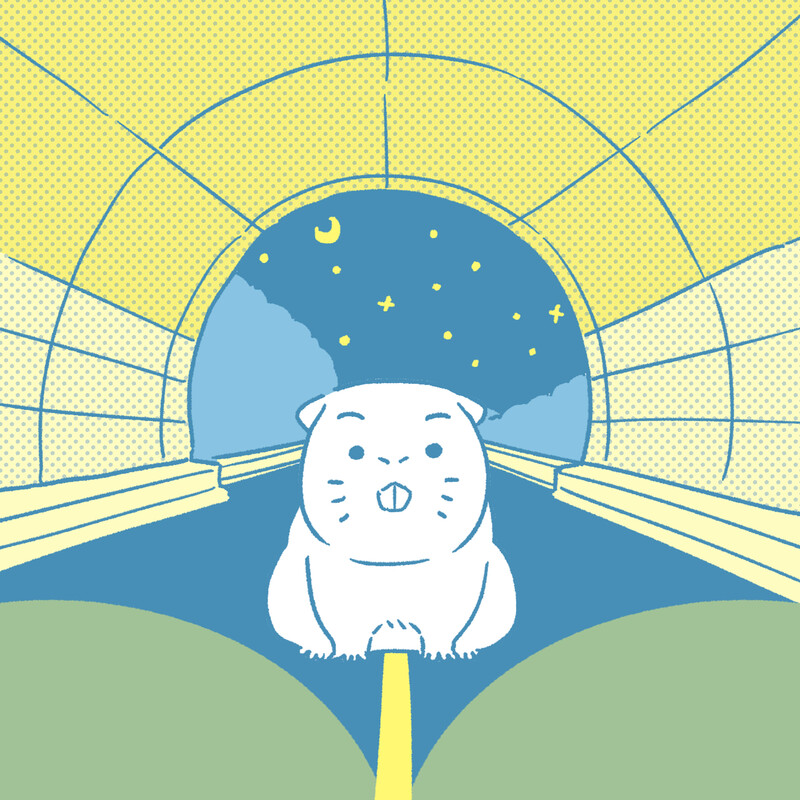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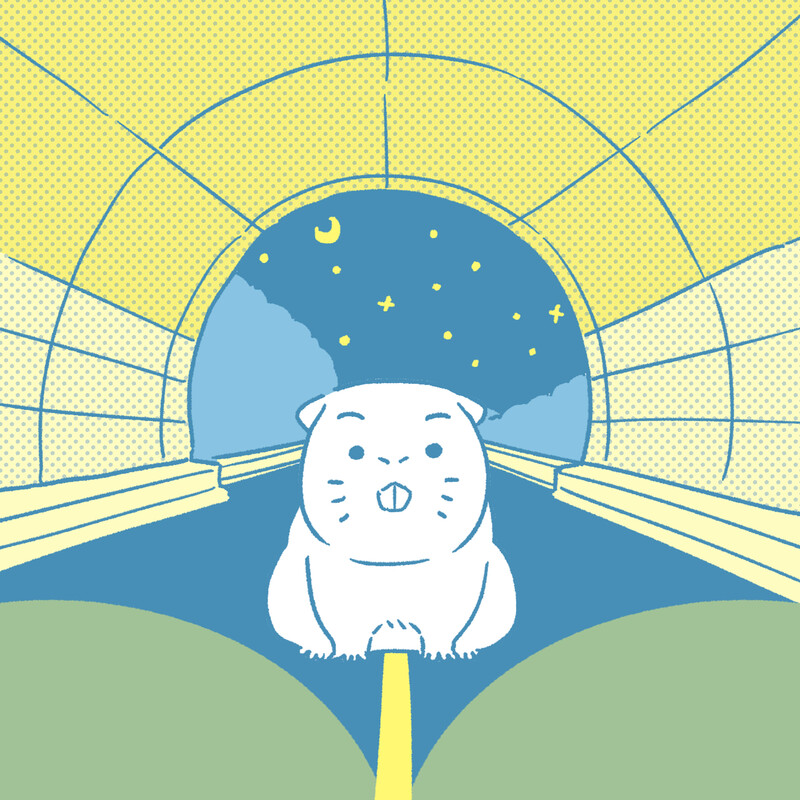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