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2 19:35
수정 : 2018.05.02 20:33
[ESC] 커버스토리| 모녀
65살에 사진 입문한 한설희
첫 피사체로 어머니 선택
90대 어머니 사진에서 자신 발견
<엄마, 사라지지 마> <엄마> 등 출간
 |
|
마당에 나온 어머니. 2013년 9월6일. 사진 한설희 제공
|
금세라도 후드득 힘없이 빠질 듯한 희고 가는 머리카락. 그것을 애써 부여잡은 손마디는 쭈글쭈글 긴 시간의 흔적이 박혀 있다. 한설희(70)씨의 카메라에 잡힌 어머니는 앙상하고 메마른 겨울나무 같았다. 1920년에 태어나 아흔다섯 해를 산 어머니 박성보씨.
 |
|
어머니가 가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다. 사진 한설희 제공
|
“어머니는 식물처럼 조용하고 독립적인 분이었다. 우리들(3남 1녀)에게 늘 ‘착하게 살아라’ 하셨다.” 지난달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추억하는 한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바람이 나 가정을 떠난 아버지를 평생 기다렸으나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이제 한씨가 2010년부터 5년간 그를 찍어 만든 까만 사진집에 있다.
 |
|
더 연약해진 어머니. 2015년 2월6일. 사진 한설희 제공
|
“갑자기 아버지가 타계하시고 황망해하던 중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늙고 병들어, 앙상하니 바싹 말라버리고 쇠잔해지신 어머니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를 추억할 사진 한 장 변변한 게 없는 걸 깨달은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늙고 병들어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어머니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
|
거울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고운 여자. 사진 한설희 제공
|
물론 어머니 때문에 그가 사진기를 든 건 아니다. “젊은 시절 잠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으나 가세가 기우는 등 여러 사정으로 내려놨다. 어머니처럼 나도 늙고 아이들이 품을 떠난 후 지난날의 감성이 살아났다.” 그의 나이 65살 때다. 전문 사진가도 쉼터를 찾아 몸을 뉠 나이다. 하지만 그는 중앙대 사진아카데미 문을 두들겨 아들, 손자뻘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배움에 정진했다. 첫 피사체로 어머니를 선택했다.
 |
|
생신을 맞은 어머니가 촛불을 끄고 있다. 사진 한설희 제공
|
흔히 카메라는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라고 했다. 한씨는 어머니의 사진에서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점점 쇠퇴해 가는 어머니를 찍기 위해 자주 찾아갔다. 외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어떤 면을 발견했고 거기에 내가 있었다.” 지금 돌아보니 사진 작업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돌봐드리게 된 계기가 돼 감사하다”고 한다.
 |
|
앙상한 어머니의 등에서 지난 시절 긴 여정이 느껴진다. 사진 한설희 제공
|
2011년 한국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모여 제정한 ‘은빛사진상’을 수상한 그는 2012년엔 갤러리 류가헌에서 개인전 ‘노모’를 열었고 그해 11월엔 <엄마, 사라지지 마>(북노마드), 2017년엔 <엄마>(눈빛)를 출간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사진 한설희 제공
모녀 사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이르는 말.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뿌듯해하거나 원망하는 딸, 자신의 삶과 같거나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엄마. 연관 검색어로 ‘모녀 여행’ ‘모녀 커플룩’ ‘모녀 영화’가 뜰 정도로 모녀 사이는 독특한 점이 있는 가족 관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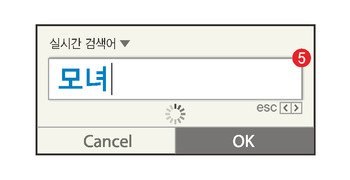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