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24 20:42
수정 : 2019.04.19 10:04
[책과 생각] 권혁란의 관계의 맛
 |
|
구순 엄마의 생일잔치가 열린 날. 다른 할머니들도 기뻐 보인다. 요양원엔 100살인 할머니도 계신다. 사진 권혁란
|
“엄마, 나도 나중에 여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햇볕 잘 들어오고 공기도 맑고. 적당한 온도에, 내 침대 하나 있고. 때 되면 목욕을 시켜주고. 시간 딱딱 맞춰서 밥해 주고, 24시간 보살펴 주니까.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여럿 있으니 뭘 더 바랄 것도 없잖아.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지만 내 본심이기도 했다. 듣기에 따라 버릇없고 못된 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언젠가 맞이할 상황일 수도 있는 일이다. 나이 들고 몸 아프면, 가족이 곁에 없고 자녀가 바쁘거나 없으면? 그때는 누구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딘가에 의탁해서 살 수밖에. 피로 연결된 가족의 도움이 아닌, 돈으로 산 낯선 이의 그것이 딱히 구차하고 비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구에 닥칠 일이니 마음과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여러 명의 친구가 병에 걸렸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나이 듦과 아픔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곧 다가올 일들이다. 내 엄마와 내 일이기만 한가. 다 자란 내 딸들도 내 뒤에서 내게로 올 늙음과 병 얻은 후의 수발을 걱정한다. 이 말을 할 때도 등 뒤에 딸이 듣고 있었다.
구십살, 엄마 연배의 할머니 셋이 쓰는 국화 방 팻말이 달린 문 앞에서였다. 걸음이 불편한 엄마가 체중을 실은 보조기구를 양손으로 밀면서 유치원 교실같이 명랑한 그림이 달린 문으로 들어가려던 때였다. 방금 요양원 입구에서 상봉하자마자 습관처럼 눈물 바람을 하셔서 흐릿하게 젖은 얼굴의 엄마가 반짝 돌아보셨다. 숨기지 않는, 노기 같은 섭섭함이 내비쳤다.
 |
|
손을 쓰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콩나물을 다듬는 할머니들 표정이 밝고 보기 좋다. 사진 권혁란
|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나. 어디 먼 곳에 내던져졌다고 속상하신 건가. 그 옛날 양로원 같은 것으로 여기시나. 집 안에서 학대받을 수도 있는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리가 있나, 이해해 드리기 꺼려질 뿐. 노환과 병이 겹치기 전부터 엄마는 시골에 살았던 분이다. 지금의 내 나이 전부터 눈물이 흔한 사람이기도 했다. 강인하고 희생적이기보다는 그저 낳았고 자라면 떠나보낸 약간 ‘동물 세계의 엄마’같았다. 집에 계시기보단 마을회관에 가서 노래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으니 지금의 공간과 시간을 나빠할 이유도 싫어할 까닭도 없다.
나란한 침대가 셋. 하얀 서랍장이 셋. 흰 거즈와 밤샘용 기저귀가 개켜져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었다. 커다란 앞치마를 입은 요양사와 간호사가 따라오며 방의 집기와 엄마의 하루 생활을 이야기해주었다. “종종 집에 가고 싶다고 우시기도 하지만 아주 건강하신 편이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 어려운 가사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요. 노래방기계를 틀어드리면 수십 곡을 다 부르신다니까요.”
왜 아니겠는가. 엄마는 공부를 무척 하고 싶어하던 여자였다. 한글만 간신히 깨우친,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순수한 땅의 여자로 살았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땅에서 나는 것들과 씨름을 했고 놀이를 하면서 그것들을 먹고 키우고 예뻐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요양원에 가서야 엄마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네 살짜리 애기들처럼 꽃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이름 석 자를 적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소녀를 그리고 숫자를 세어 쓰고 개구리를 접고 색종이를 오려 붙였다. 그 모든 엄마의 작품들은 이름을 붙이고 하얀 벽에 붙여졌다. 물리치료를 받고 체조를 하고 플라스틱 볼링을 치고 고리던지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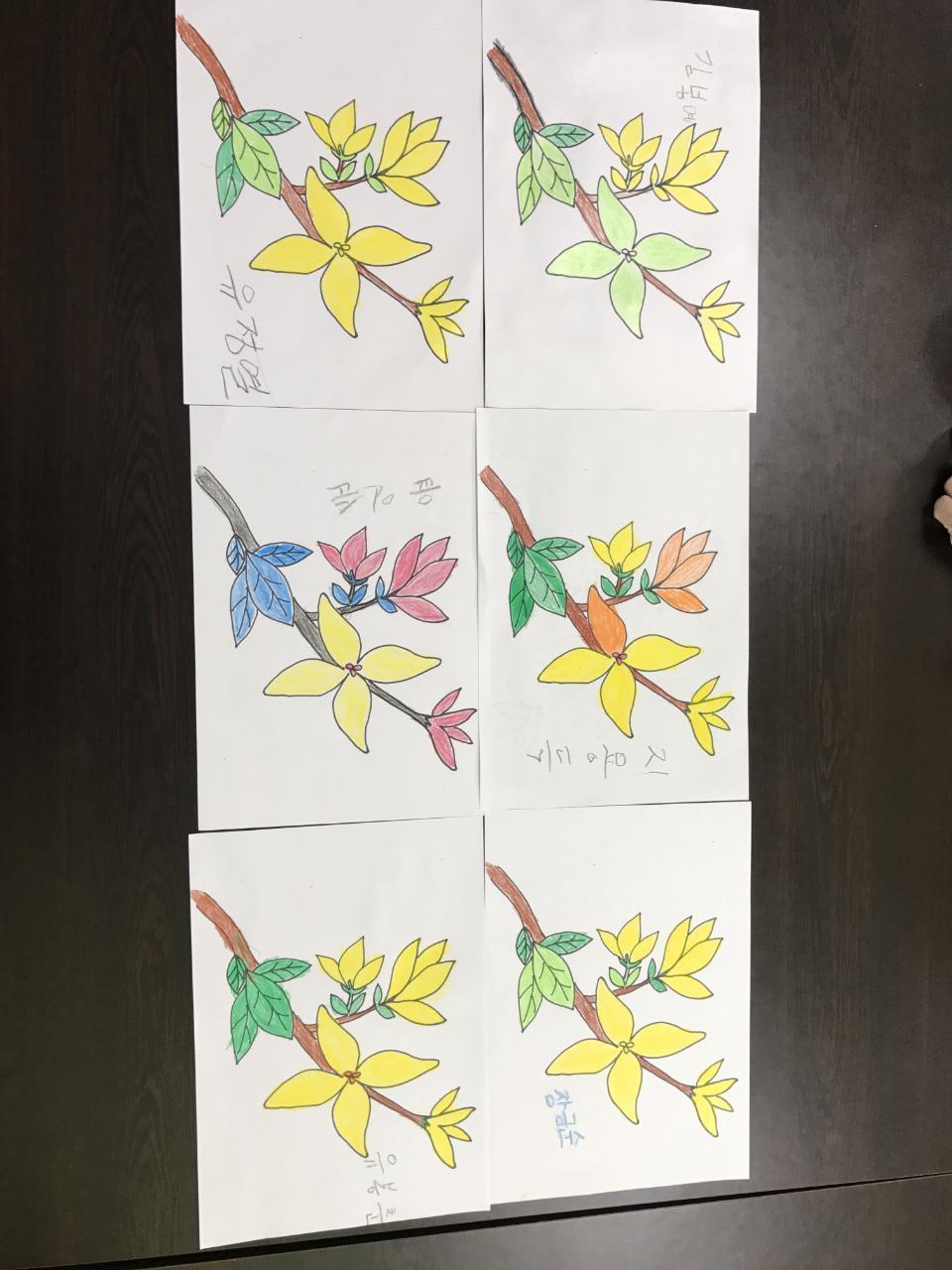 |
|
80, 90, 100살 할머니들이 그린 꽃. 사진 권혁란
|
그래도 가장 생기 있어 보일 때는 그토록 지겨워하면서도 재미있어하던 곡식을 만지는 일, 반찬을 만드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을 때였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래기 껍질과 마늘을 까고 가끔 콩을 고르고 있을 때 엄마의 몸짓은 나름대로 쓸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적당한 긴장이 살아나 보기 좋았다.
요양원 ‘밴드’에는 거의 매일 일상의 사진들이 업데이트되었다. 유치원 아동의 활동과 거의 비슷했지만 다른 것은 물리치료기에 누워있는 혼곤한 잠에 빠진 몸이 너무 낡았다는 것, 깎아놓은 밤송이 같은 윤기 나는 머리통이 아니라 짧게 깎은 부스스한 흰 머리칼이라는 것뿐. 밴드 속 사진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계실 때, 꽃구경할 때, 공부할 때 독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얼굴을 확대해 들여다보았다. 엄마뿐 아니라 옆 침대 할머니들도. 어떤 자녀가 있어 다정하게 매일 카메라를 들어 구순 넘어 백살이 다 된 부모의 사진을 찍어 올리겠는가. 어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앨범을 만들 부모는 있어도 거꾸로 할 자식은 드물다. ‘내’가 부모를 ‘집’에 ‘모신다’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요양원’에서 ‘남’이 ‘보살피는’ 날마다 일들을 때론 고마워하며 종종 무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날들이 간다.
“그저께 밤에는 나가서 자고 어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니나노 늴리리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휴대폰에는 엄마가 부른 노래가 들어있다. 가끔 얼토당토않은 구순 엄마의 이런 노래를 듣는다.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늙지를 않아 엄마 마흔에 부를 때와 똑같다.
권혁란 전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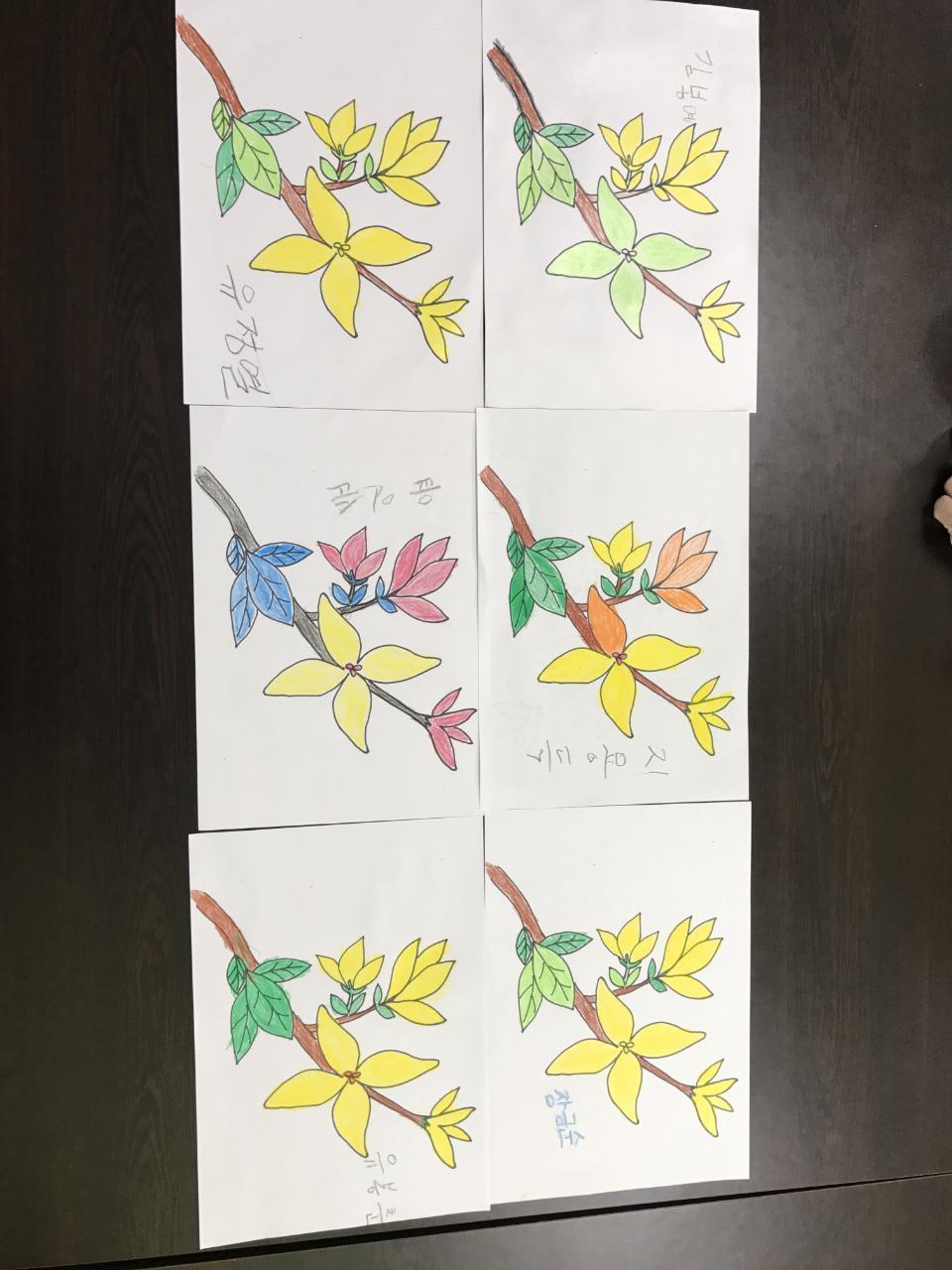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