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4 14:35
수정 : 2018.09.14 14:45
 |
|
오민의 ‘연습곡’. 사진 이우성 제공
|
이우성의 낙서 같아
 |
|
오민의 ‘연습곡’. 사진 이우성 제공
|
요즘은 시를 쓰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형식을 찾지 못했다. 어떤 형식은 꽤 마음에 들지만 거기 담아야 할 언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를 쓸 수는 있다. 문예지 청탁을 받으면 쓰기는 쓴다. 그러나 무엇인가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 시인으로서 나는, 허물어지고 있다. 그게 뭐 어때, 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슬프고 차갑다. 혀 끝에 단어 하나를 올려 두고 지낸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두고 오물거린다. ‘단련’이다.
신사동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제1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작가 이름은 ‘오민’이고, 전시명은 ‘연습곡’이다. 몇 개의 영상 작품이 전시되었다. 영상 속에서 등장 인물은 무엇인가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자에 앉아 눈을 뜨고 멀뚱히 바라본다. 가만히 있다. 졸기도 한다. 가까스로 깨서 다시 바라본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하고 있다. 나는 약간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내가 나에게 계속 해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쓰지 않지만 쓰고 있어, 라고.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시인들이 시를 쓰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해 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등장 인물을 계속 보면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나에겐 그 혹은 그녀가 단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연습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영상에서도 등장 인물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다. 숲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단단한 벽을 마주서서 바라본다. 바람이 불고 나무와 잎들이 흔들린다. 등장 인물도 흔들린다. 흔들리며 중심을 잡고 선다. 그리고 본다. 보고 보고 또 본다. 본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연습곡’이라는 전시명이 나에겐 비장하게 읽힌다.
전시장 내부엔 상자들이 놓여 있다. 앉아서 작품을 오래 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전시장 내부를 요란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 돼 버렸다. 전시장 내부에 포토 존 같은 것들을 두기도 한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겠지만 요란하고 가득하면 볼 수가 없다. 의미와 의의를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돼 버린다. 그런 면에서 ‘연습곡’의 전시장은 보고 생각하는 것, 어떤 감각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기에 좋다. 작품과 하얀 상자 주변의 빈 공간들을 걸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보거나 떠올릴 수 있다.
작품은 영상 화면 안에만 있지 않다. 보이지 않지만 더 있다. 결국 보고 또 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결국 답이라는 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다. 전시는 11월 4일까지 볼 수 있다.
시인·미남컴퍼니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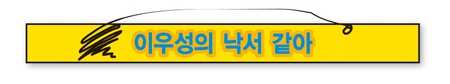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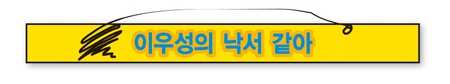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