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31 09:36
수정 : 2018.08.31 09:48
 |
|
<베틀, 배틀> 전시 작품 일부. 사진 이우성 제공
|
이우성의 낙서 같아
 |
|
<베틀, 배틀> 전시 작품 일부. 사진 이우성 제공
|
나는 이 전시가 재미있지 않았다. 전시 제목은 <베틀, 배틀>이다. ‘베틀’은 옷감을 짜는 도구고, 배틀은 ‘전투’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그래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전시는 옷이 지닌 역사성을 되짚는다.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다른 작가의 작품과 ‘배틀’한다. 혹은 특정 이념이나 시대성과 ‘배틀’한다. 그런데 ‘베틀’을 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인간이 옷으로 규정하고 억압한 사상이 있을 것이다. ‘사상’이란 단어가 적합할까를 두고도 고민해야 할 텐데, 일단 미뤄두고, 예를 들어 인간은 옷으로 신분을 나누었다. 또한 성별을 나누었다. 너는 응당 이래야 해, 라는 명령을 옷을 통해 전달했다. 왕의 옷이 따로 있고, 여성의 옷이 따로 있다. 전시에 참여한 몇몇 작가들은 이러한 사상을 거론한다. 다행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하진 않는다. 앞의 문장에 ‘다행히’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내가 지닌 ‘정치성’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다행히’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게 왜 다행인가? 폭력적인 방식은 왜 나쁜가? 어떤 방식이 폭력적인가? 질문할 수도 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런 질문들 자체에 손사래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성들이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하고 있는, 차별의 역사는 물론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이 전시가 옷의 역사성을 언급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역사성을 언급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또 나는 할 말이 없다. ‘베틀’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전시엔 모두 10팀이 참여했다. 각각의 작품에 함의된 언어들이 전체 기획 안에서 일관되고 다채로운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나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옷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억압의 흐름 자체에 내가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이 전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앞의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
옷에 대한 담론은 완전히 ‘핫’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가 스트리트 브랜드와 협업하는 시대다. 트레이닝 팬츠와 러닝 슈즈가 스포츠 브랜드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마저 유행을 넘어서는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다. 이러한 흐름 안에 담긴 시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상업 브랜드가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게 나는 조금 안타깝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전시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뭐 이렇게 고민할 만큼 문제적인 전시였나, 싶기도 하고. 음, 그런가? 9월9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베틀’의 ‘배틀’이 이어진다.
이우성(시인·미남컴퍼니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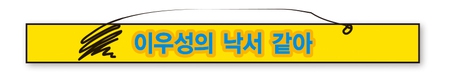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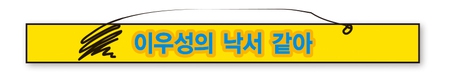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